🌍 만약에 한국이 2018년 종전선언을 성사시켰더라면? (2편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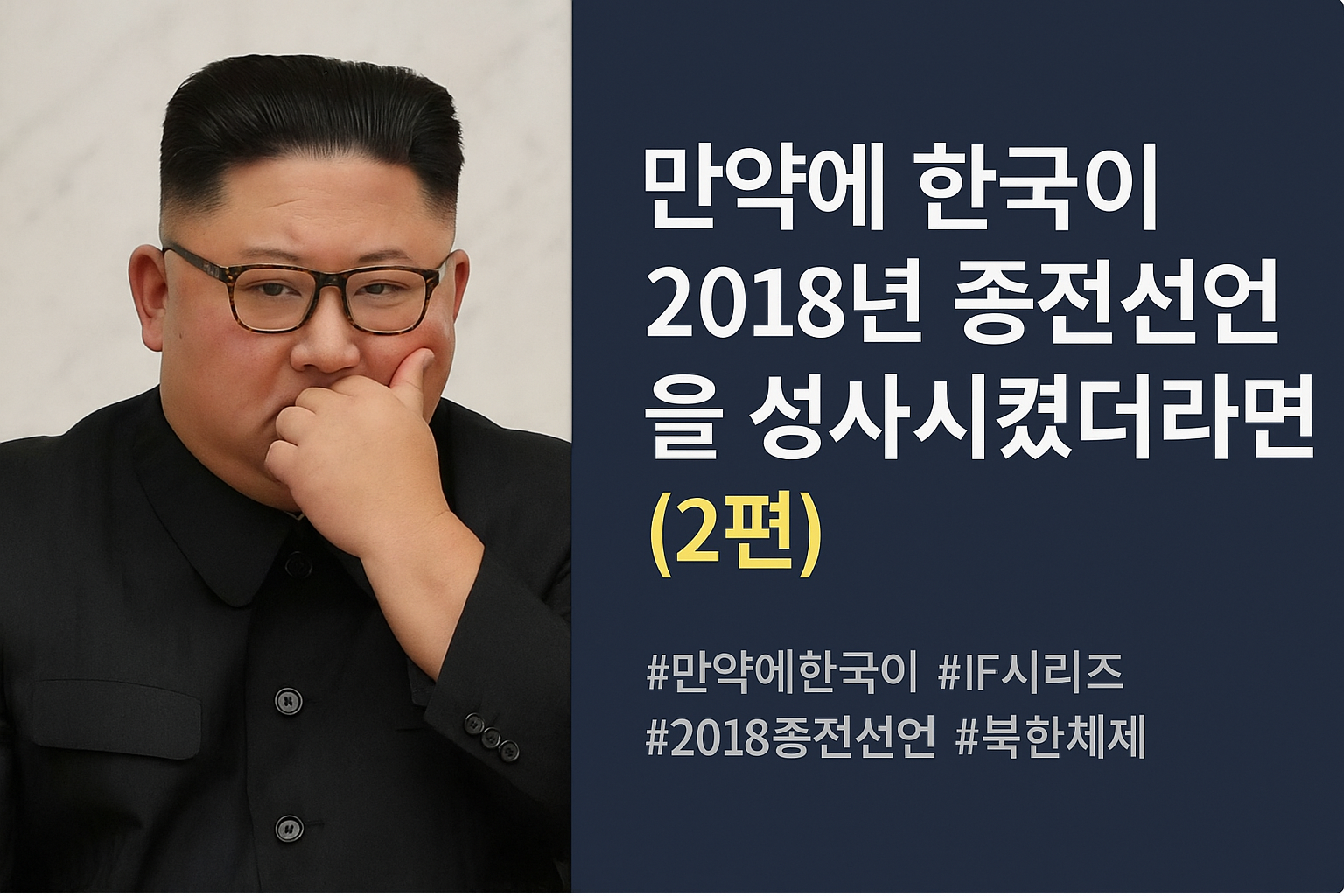
❗ 북한의 딜레마 – 종전선언 이후의 체제
⚠️ 현실 문제
북한 체제의 생존 공식은 단순하다.
- 늘 전쟁 위기를 강조해 인민을 단속한다.
- 국제 긴장을 고조시켜 외부 지원을 뜯어낸다.
- 내부 자유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해 권력을 고정한다.
즉, **“우린 늘 위험하다”**는 명분이 곧 정권의 버팀목이었다.
하지만 종전선언은 이 명분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칼날이 된다.
🕊️ IF 전개 – 종전선언 이후
만약 2018년에 종전선언이 성사됐다면, 북한은 곧바로 딜레마에 직면했을 것이다.
- 국제사회는 북한에 미사일 발사 자제 압력을 강화
- 군부는 불만을 품고, 인민은 평화를 기대하며 내부 균열 발생
- 김정은은 “이거 괜히 했나?”라는 후회 모드에 빠짐
💸 경제적 변화
종전선언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온다.
- 국제기구(WFP, UNDP 등) 를 통한 인도적 지원 확대 → 주민에게 직접 전달
- 시장화 가속: 장마당이 더욱 활발해지며 국가 통제력 약화
- 외부 정보 유입 증가 → 인민들의 의식 변화 촉진
북한 내부에서 처음으로 **“체제가 변할 수도 있다”**는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.
🏚️ 체제 흔들림
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“미국이 침략한다”는 공포를 팔아 권력을 유지했다.
하지만 종전선언 이후엔 그 공포 장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.
“평화가 왔다면서 왜 계속 총동원 하라는 거냐?”는 질문이 내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.
김정은은 체제 붕괴의 징후를 처음으로 직접 체감했을 것이다.
⚖️ 시사점
종전선언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, 북한 내부 체제에 직접적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.
긴장을 명분으로 삼는 체제는, 평화의 순간부터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한다.
🤣 드립 마무리
북한 군부: “원수님, 이제 뭐 쏘죠?”
김정은: “불꽃놀이라도 할까?” 🎆
'만약에 한국이... 시리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🌍 만약에 한국이 2018년 종전선언을 성사시켰더라면? 📖 에필로그 – 종전선언의 아쉬움과 상상 (6) | 2025.08.28 |
|---|---|
| 🌍 만약에 한국이 2018년 종전선언을 성사시켰더라면? (3편) (10) | 2025.08.28 |
| 🌍 만약에 한국이 2018년 종전선언을 성사시켰더라면? (1편) (2) | 2025.08.28 |
| 만약에 한국이 IMF를 피했다면? 3편: 위기를 비껴간 한국, 달라진 2000년대 (3) | 2025.08.22 |
| 만약에 한국이 IMF를 피했다면? – 2편DJ의 조기 집권, 준비된 대통령 (0) | 2025.08.22 |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