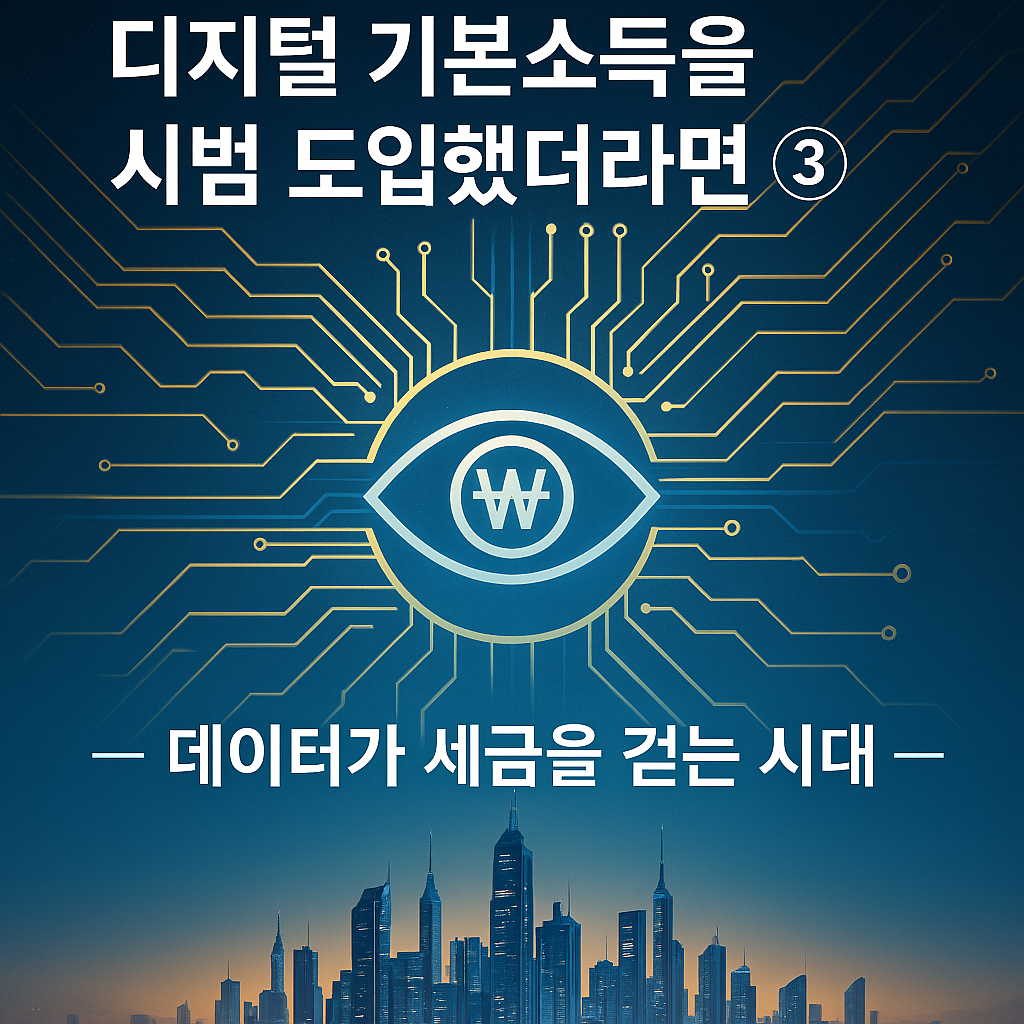
🇰🇷 만약에 한국이 2020년에 디지털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했더라면
🌍 3편. 2030 – 데이터가 세금을 걷는 시대
“AI가 조세를 계산하고, 복지를 자동으로 분배한다.”
🤖 2030년, 대한민국.
10년 전 위기 속에 태동했던 디지털 기본소득 실험은
이제 전 국민 제도로 정착했다.
이제 더 이상 사람은 세금을 직접 내거나 복지를 신청하지 않는다.
AI 재정 알고리즘이 개인의 소득·소비·데이터 기여도를 분석해
세율과 복지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.
은행 창구 대신 블록체인, 공무원 대신 알고리즘.
세상은 ‘행정국가’에서 ‘데이터국가’로 바뀌었다.
📊 국가의 뇌는 AI였다.
한국 정부는 2027년 ‘국가 디지털 재정 시스템(NDFS)’을 완성했고,
모든 세금·보조금·보험금이 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돌아갔다.
AI는 각 시민의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
“소득 대비 소비 비율, 건강지표, 고용 안정성” 등을 분석했다.
그 결과, 복지금은 자동으로 지급되고, 세금은 자동으로 차감되었다.
IMF와 OECD는 이 모델을
“세계 최초의 데이터–경제 통합국(Data-Economy Integrated State)”
이라고 평가했다.
한국은 행정비용을 60% 절감했고,
부패율은 1% 미만으로 떨어졌다.
💠 국민의 역할도 달라졌다.
사람들은 더 이상 복지를 ‘받는 존재’가 아니었다.
자신의 데이터 생산이 곧 국가 기여로 환산되고,
AI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상을 산출했다.
“노동이 아니라, 데이터가 소득을 만든다.”
이 문장은 새로운 국민헌장의 문구가 되었다.
심지어 학생·예술가·연구자도
자신이 만든 콘텐츠나 지식 데이터를 통해
‘기본소득 + 창의보상금’을 동시에 받았다.
국가는 이제 데이터를 화폐로 삼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완성한 것이다.
⚠️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.
정부의 데이터 관리권이 막강해지면서
“프라이버시 침해”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.
일부 시민단체는
“AI 정부가 인간의 자유를 세금으로 환산하고 있다”
며 시위를 벌였다.
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편리함과 효율을 택했다.
“세금이 알아서 빠지고, 복지가 알아서 들어오는데 누가 불만이냐?”
그 말이 대세가 되었다.
📌 핵심 메시지
“한국은 더 이상 노동으로 부를 창출하지 않았다.
대신 데이터가 세금을 내고, AI가 복지를 줬다.”
✍️ 시리즈 전체 메시지
“코로나는 위기였지만, 한국은 그걸 실험의 기회로 바꿨다.
돈은 사라졌지만, 데이터는 남았다.
그때의 한 걸음이, 지금의 문명을 만들었다.”
🔥 한 줄 요약:
“2020년, 한국은 돈을 뿌렸다면 끝이었을 것이다.
하지만 데이터를 심었기에 — 지금의 문명을 수확했다.”
'만약에 한국이... 시리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🌏 〈만약에 소련이 1945년 8월 8일 대일 참전을 3일 늦췄더라면?〉🌏 제2편 – 경계의 국가: 최전선의 탄생 (1945~1955) (0) | 2025.11.05 |
|---|---|
| 🌏 〈만약에 소련이 1945년 8월 8일 대일 참전을 3일 늦췄더라면?〉제1편 – 8월의 그림자: 지연된 침공 (0) | 2025.11.05 |
| 🇰🇷 만약에 한국이 2020년에 디지털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했더라면💻 2편. 2022 – 실험이 바꾼 사회 (0) | 2025.10.17 |
| 🇰🇷 만약에 한국이 2020년에 디지털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했더라면1편. 2020 – 위기 속의 실험 (0) | 2025.10.17 |
| 《만약에 대한민국이 – 노무현 정부가 더 오래 갔다면?》💡 3편. 디지털 민주주의의 시대 ― 시민이 국가를 움직이다 (0) | 2025.10.16 |



